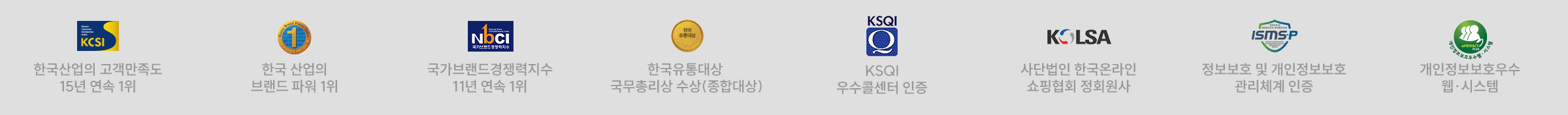YES24 카테고리 리스트
YES24 유틸메뉴
- Global YES24안내보기
-
Global YES24는?
K-POP/K-Drama 관련상품(음반,도서,DVD)을
영문/중문 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Korean wave shopping mall, sell the
English
K-POP/K-Drama (CD,DVD,Blu-ray,Book) We aceept PayPal/UnionPay/Alipay
and support English/Chinese Language service作为出售正规 K-POP/K-Drama 相关(CD,图书,DVD) 韩流商品的网站, 支持 中文/英文 等海外结账方式
中文Exclusive ticket sa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p artists
Global yesticket
어깨배너
| 정가 | 5,600원 |
|---|---|
| 판매가 | 5,600원 |
| YES포인트 |
|
| 추가혜택쿠폰 |
쿠폰받기
|
|---|
| 결제혜택 | 카드/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카드/간편결제 혜택 보기/감추기 |
|---|
-
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이며, 배송되지 않습니다. eBook 이용 안내
| 구매 시 참고사항 |
|
|---|
절판
- 구매 후 바로 읽기 eBook 이용안내
- 이용기간 제한없음
-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
이 상품의 구매 시리즈 (89개)
품목정보
| 발행일 | 2017년 06월 16일 |
|---|---|
| 이용안내 |
|
| 지원기기 | 크레마 /PC(윈도우 - 4K 모니터 미지원) /아이폰 /아이패드 /안드로이드폰 /안드로이드패드 /전자책단말기(일부 기기 사용 불가) /PC(Mac) |
| 파일/용량 | EPUB(DRM) | 28.17MB 파일/용량 안내 |
| 글자 수/페이지 수 | 약 3.6만자, 약 1.2만 단어, A4 약 23쪽 글자 수/페이지 수 안내 |
| ISBN13 | 9788932030159 |
이 상품의 이벤트 (8개)
-
2024년 04월 01일 ~ 2024년 04월 30일
-
2024년 03월 21일 ~ 2024년 08월 31일
-
2023년 02월 09일 ~ 2024년 12월 31일
-
상시
소개
목차
출판사 리뷰
회원리뷰 (16건)
매주 10건의 우수리뷰를 선정하여 YES포인트 3만원을 드립니다.3,000원 이상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일반회원 300원, 마니아회원 600원의 YES포인트를 드립니다.
eBook은 다운로드 후 작성한 리뷰만 YES포인트 지급됩니다.
클래스, CD/LP, DVD/Blu-ray, 패션 및 판매금지 상품, 예스24 앱스토어 상품 제외됩니다. 리뷰/한줄평 정책 자세히 보기 리뷰쓰기
15명의 예스24 회원이 평가한 평균별점
- 10대
- 20대
- 30대
- 40대
- 50대
한줄평 (19건)
1,000원 이상 구매 후 한줄평 작성 시 일반회원 50원, 마니아회원 100원의 YES포인트를 드립니다.eBook은 다운로드 후 작성한 리뷰만 YES포인트 지급됩니다.
클래스, CD/LP, DVD/Blu-ray, 패션 및 판매금지 상품, 예스24 앱스토어 상품 제외됩니다. 리뷰/한줄평 정책 자세히 보기
배송/반품/교환 안내
배송 안내
| 배송 구분 |
구매 후 즉시 다운로드 가능
|
|---|
반품/교환 안내
※ 상품 설명에 반품/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. (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)
| 반품/교환 방법 |
|
|---|---|
| 반품/교환 가능기간 |
|
| 반품/교환 비용 |
|
| 반품/교환 불가사유 |
|
| 소비자 피해보상 |
|
|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|
|







.jpg)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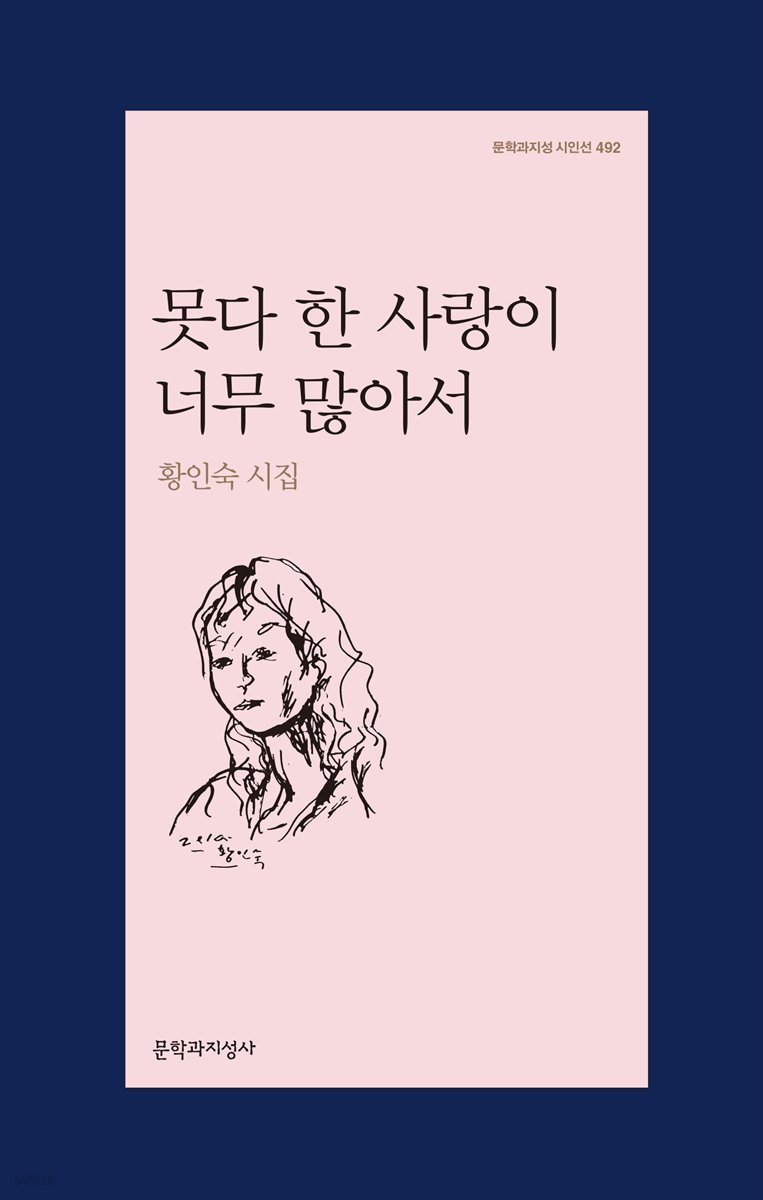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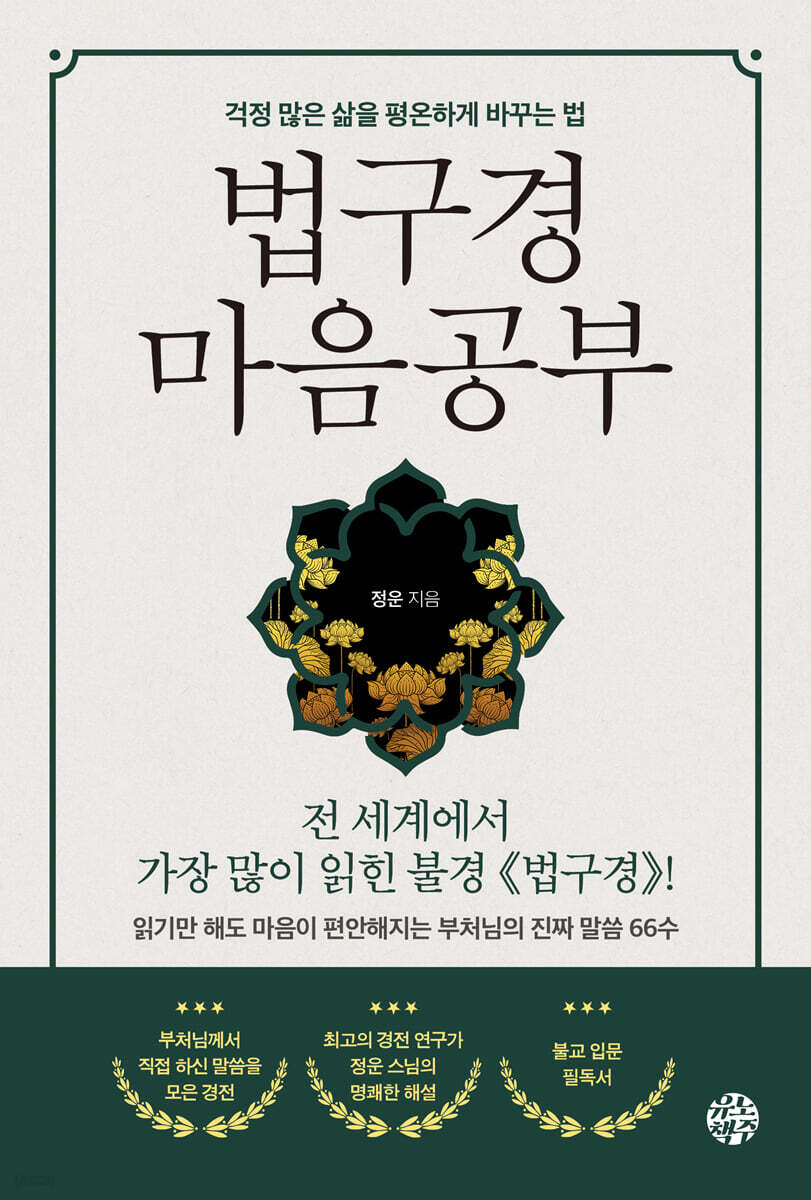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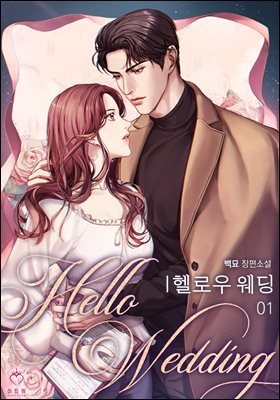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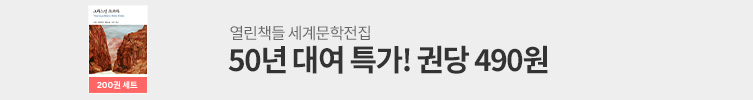



![[eBook 쇼핑 혜택] READ NOW](http://image.yes24.com/images/13_EventWorld/179615_02.jpg)

![[일요일 20시까지] 이 주의 오구오구 페이백!](http://image.yes24.com/images/13_EventWorld/174086_78.png)

.jpg)
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