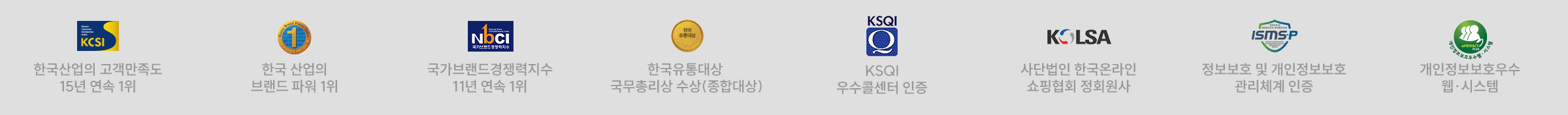YES24 카테고리 리스트
YES24 유틸메뉴
- Global YES24안내보기
-
Global YES24는?
K-POP/K-Drama 관련상품(음반,도서,DVD)을
영문/중문 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Korean wave shopping mall, sell the
English
K-POP/K-Drama (CD,DVD,Blu-ray,Book) We aceept PayPal/UnionPay/Alipay
and support English/Chinese Language service作为出售正规 K-POP/K-Drama 相关(CD,图书,DVD) 韩流商品的网站, 支持 中文/英文 等海外结账方式
中文Exclusive ticket sa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p artists
Global yesticket
어깨배너
| 정가 | 13,000원 |
|---|---|
| 판매가 | 11,700원 (10% 할인) |
| YES포인트 |
|
| 결제혜택 | 카드/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카드/간편결제 혜택 보기/감추기 |
|---|
| 구매 시 참고사항 |
|
|---|
절판
- 수량
- 해외배송 가능
- 최저가 보상
-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
품목정보
| 발행일 | 2010년 07월 01일 |
|---|---|
| 쪽수, 무게, 크기 | 304쪽 | 440g | 150*196*30mm |
| ISBN13 | 9788991684676 |
| ISBN10 | 899168467X |
이 상품의 이벤트 (6개)
-
사은품
4월의 굿즈 :책가도 독서대/스마트폰 거치대/우양산/북 스토퍼/우드 센서 무드등
국내도서/외국도서/직배송 GIFT 5/7만원 이상, eBook/크레마 5만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 택1 증정 (포인트 차감)
2024년 03월 29일 ~ 2024년 04월 30일
책소개
-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. 미리보기
목차
상세 이미지

책 속으로
출판사 리뷰
회원리뷰 (16건)
매주 10건의 우수리뷰를 선정하여 YES포인트 3만원을 드립니다.3,000원 이상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일반회원 300원, 마니아회원 600원의 YES포인트를 드립니다.
eBook은 다운로드 후 작성한 리뷰만 YES포인트 지급됩니다.
클래스, CD/LP, DVD/Blu-ray, 패션 및 판매금지 상품, 예스24 앱스토어 상품 제외됩니다. 리뷰/한줄평 정책 자세히 보기 리뷰쓰기
16명의 예스24 회원이 평가한 평균별점
- 10대
- 20대
- 30대
- 40대
- 50대
한줄평 (0건)
1,000원 이상 구매 후 한줄평 작성 시 일반회원 50원, 마니아회원 100원의 YES포인트를 드립니다.eBook은 다운로드 후 작성한 리뷰만 YES포인트 지급됩니다.
클래스, CD/LP, DVD/Blu-ray, 패션 및 판매금지 상품, 예스24 앱스토어 상품 제외됩니다. 리뷰/한줄평 정책 자세히 보기
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.
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.
배송/반품/교환 안내
배송 안내
| 배송 구분 |
예스24 배송
|
|---|---|
| 포장 안내 |
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,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.
목적 : 안전한 포장 관리 |
반품/교환 안내
※ 상품 설명에 반품/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. (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)
| 반품/교환 방법 |
|
|---|---|
| 반품/교환 가능기간 |
|
| 반품/교환 비용 |
|
| 반품/교환 불가사유 |
|
| 소비자 피해보상 |
|
|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|
|








.jpg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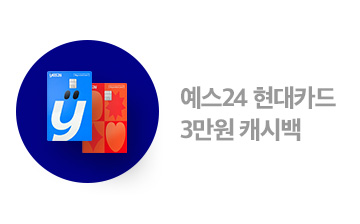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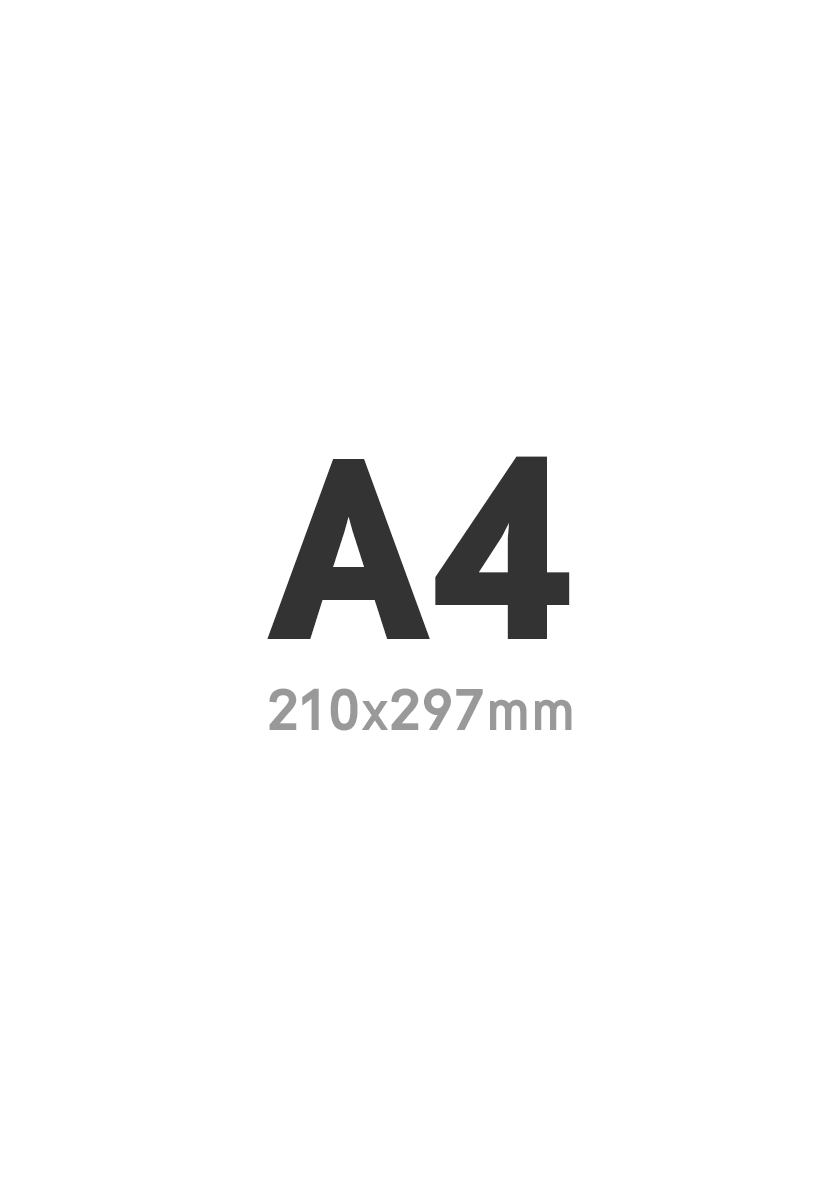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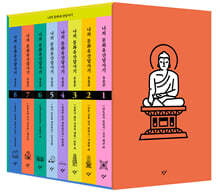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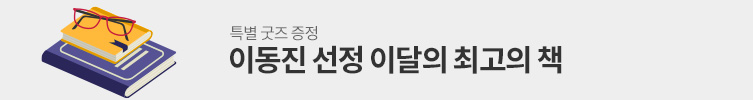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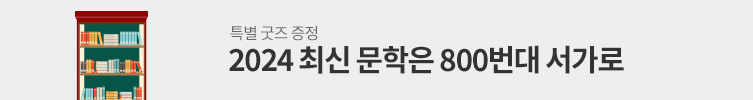
![어서오세요, [클래스24] 입니다](http://image.yes24.com/images/00_Event/2024/0214classopen/bn_138x85.jpg)
![[2024 세계 책의 날] 책을 ( ) 하다](http://image.yes24.com/images/00_Event/2024/0401bookworld/bn_138X85.jpg)



![예스24 X JTBC <소탐대실> 콜라보 [서탐대실]](http://image.yes24.com/images/00_Event/2023/0921Youtube/bn_138x85.jpg)